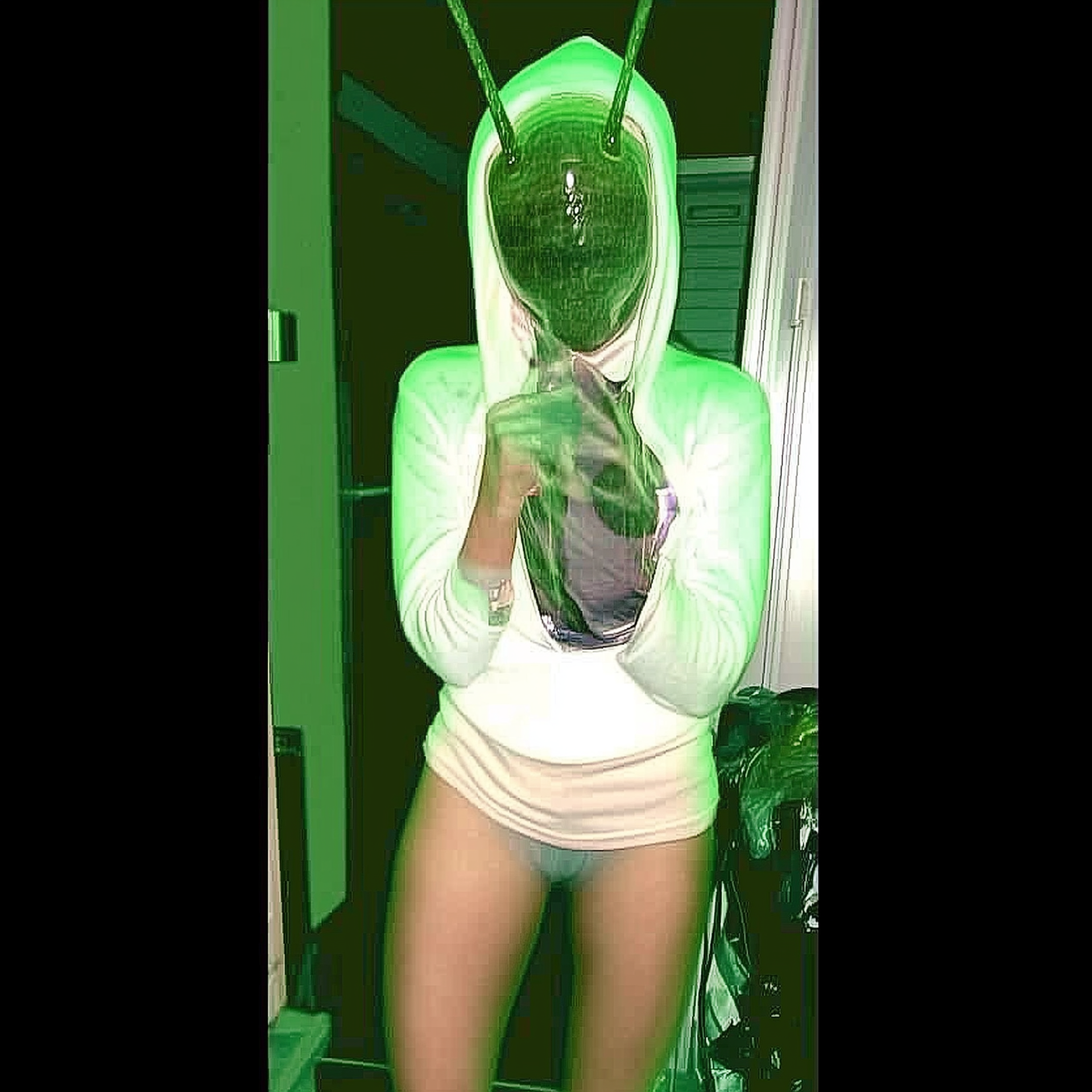CROWD-FUNDING
MADE W.W. II'S WINNER
: WAR BONDS
War isn’t just fought with blood and bullets. The scarier part is money. To fire a shot, you need steel; to float a ship, you need oil. The problem is, government vaults have a habit of emptying out instantly. Enter the relief pitcher: the war bond, or simply, the War Bond.
전쟁은 피와 총알로만 치러지지 않는다. 사실 더 무서운 건 돈이다. 총탄을 쏘려면 강철이, 군함을 띄우려면 석유가 필요하다. 문제는, 정부 금고가 순식간에 텅 빈다는 사실이다. 이때 등판한 것이 전쟁채권, 이른바 워본드(War Bond)다.
the 8th war bond
To win the war, you must secure the bonds. But let’s be honest—it wasn’t a hit from day one. After all, America is a nation of immigrants. To glue these individualistic souls together, a new logic was needed. A new strategy. It wasn't about where you came from, but encouraging the idea that the land you stood on now was your true country.
전쟁채권을 잡아야 승리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팔린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이지 않은가. 개별화된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했다. 즉, 새로운 공략이. 미국은 출신 국가가 아닌,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조국임을 격려했다.
The propaganda posters put forward by the US government featured striking graphics. Kids saving pennies with small hands, Hollywood actresses flashing smiles while peddling bonds, and heroic soldiers shouting, “This bond is a bullet!” It turned war into a participatable event. Citizens rushed to bank counters to buy war bonds, and those slips of paper were transmuted into bullets, fighter jet engines, and scraps of military uniforms.
미국 정부가 내세운 선전 포스터에는 수려한 그래픽이 붙었다. 고사리손으로 잔돈을 모아 전쟁 채권을 사는 아이들, 미소 지으며 채권을 권하는 여배우, “이 채권 한 장이 총알 한 발이다”라고 외치는 영웅적 병사. 이 모든 건 전쟁을 참여 가능한 이벤트로 바꿔놓았다. 국민들은 은행 창구에서 전쟁채권을 사들였고, 그것은 전장에서의 총알로, 전투기 엔진으로, 군복의 천 조각으로 바뀌었다.
the act of purchasing war stamps
During WWI, war bonds sold in the U.S. hit $16.7 billion. In just one year, through four drives, astronomical sums were raised. The ‘Victory Liberty Loan’ scooped up $4.5 billion in a heartbeat. That’s about $170 per person at the time. Whatever the relationship was, it was inseparable. Considering the first world war cost $30 billion, you can intuitively feel the sheer impact of it.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팔린 전쟁채권은 167억 달러였다. 단 1년 동안 4차례의 모금을 통해 천문학적 규모로 팔린 것이다. 승전 후 발행된 승리채권(Victory Liberty Loan)은 단번에 45억 달러(금리 4. 75%)를 긁어모았다. 당시 미국 인구 1억 명 기준으로, 인당 약 170달러를 구매한 것이다. 1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미국 전쟁 비용은 약 300억 달러이니, 전쟁채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Meanwhile, Europe was in a nightmare trench war. The cost exceeded their total assets. They had no choice but to sell their U.S. treasuries and dump American stocks at bargain prices. And who scooped them up? The U.S., flush with war bond cash. This is where the rules of the game changed. About 70% of European capital migrated straight to Wall Street.
같은 시각, 유럽 서부 전선은 악몽 같은 참호전이 시작되었다. 전쟁 비용은 유럽 국가들의 자산 총량을 넘어섰다. 어쩔 수 없이 기존 보유하던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였다. 전쟁 전 유럽이 보유하던 미국 기업의 주식도 헐값에 쏟아졌는데, 이때 미국은 전쟁채권 자본으로 이들을 쓸어 담았다. 이 지점에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전쟁 막바지에 약 70% 유럽 자본이 미국의 월스트리트로 결집했다.
For the U.S., it was, quite literally, a jackpot. Transforming from a debtor to a creditor? Done. From a country paying off $3.7 billion to one holding $12.6 billion in European claims.
말 그대로 미국에겐 노다지였다. 채무 국가에서 채권 국가로 변신한 것이다. 유럽 채무 약 37억 달러를 갚아 나가던 빚쟁이 나라에서 유럽 채권 126억 달러를 가진 부자 나라가 된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바로 전쟁채권이었다.
This capital fattened the defense industry and laid the foundation for global economic hegemony. Eisenhower’s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e birth of Silicon Valley, the golden age of American abundance—all of this started running on the capital highway paved by war bonds.
이 돈이 군수 산업을 키웠고, 전쟁 후에는 세계 경제 패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이젠하워의 군산복합체, 실리콘밸리의 태동, 미국식 풍요의 황금기. 이 모든 건 사실 전쟁채권이 깔아놓은 자본 위에서 달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So, war bonds aren't just scraps of paper. For the people, a ‘receipt of patriotism’; for the government, a ‘deposit for victory’; and historically, the starting point of global power.
그러니 전쟁채권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국민에게는 ‘애국심의 영수증’, 정부에게는 ‘승리의 예치금’,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세계 패권의 출발점.
If today’s crowdfunding delivers a cool gadget to your doorstep, the war bond was the funding that fundamentally altered world history. It didn’t just win a war; it birthed the massive brand we know as the ‘World’s Strongest Nation, the USA.’
오늘날의 클라우드 펀딩이 멋진 물건 하나를 집 앞에 배송해주는 제도라면, 전쟁채권은 세계사를 송두리째 바꿔준 펀딩이었다. 전쟁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국 미국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켰으니 말이다.